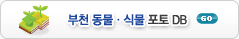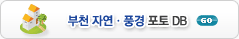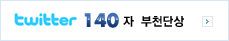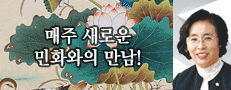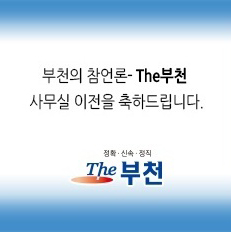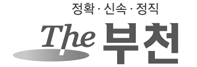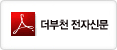부천시 사회복지과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다“는 김선광 지회장을 만나 당시 철저한 비밀에 부쳐졌던 ‘북파 공작원’ 부대의 존재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를 소개했다.
김 지회장이 ‘북파 공작원’이 된 것은 당시 21살의 나이로 동아건설에서 토목직으로 일하다가 군입대를 위해 신체검사장을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다가와 ‘2천만원을 주겠다. 좀 힘든 부대지만 외출 외박도 일반 부대와 똑같은 부대에서 돈도 벌며 군생활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말해 당시 집 한채에 300만원 하던 시절이어서 ‘그런 조건이라면 괜찮겠다 싶어 신청했다고 한다.
김 지회장에게 접근해 온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던 곳에서 북파 공작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물색관’이었다고 한다.
동기 32명과 도착한 곳은 지금의 강원도 고성군 토석면 근처로 지옥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천리행군(약 400km)을 4박5일 안에 걸어서 주파해야 했고, 보급이 없는 상황을 견디기 위해 개미를 핥아먹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었으며, 16kg의 모래배낭을 매고, 발에는 3kg의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을 뛰어다녀야 했고 매일 아침 구보는 맨발로 6km를 뛰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의 부대의 목표는 1968년 4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남파됐던 북한의 124부대로, 그들보다 같은 일을 1초라도 빨리해야 했고, 같은 시간에 1m라도 더 가야했으며, 그들이 30초에 10발을 목표에 명중시켰으면 11발을 명중시켜야 했다고 한다.
주어진 임무 역시 북한에 직접 침투해서 요인 암살, 정보 수집, 주요 시설 폭파 등으로, 북한군의 계급을 익히고 북한군의 장비를 썼으며, 제식훈련도 북한군처럼 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은 지옥훈련을 마친 뒤에는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군의 동향과 배치 등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고 한다.
북한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돌아오는 길에 지뢰 배치를 아는 비무장지대의 수색대와 약속한 시간에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 지회장은 “작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의 인민재판 현장을 직접 촬영해 모든 군의 교육용 영상으로 쓰기도 했다‘고 한다.
제대는 1976년 8월에 했지만 약속했던 돈은 없었고, 제대한 후 며칠 뒤인 8월18일 휴전선 도끼 만행사건이 일어나 원대 복귀명령이 떨어졌으나 다행히 교전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다시 사회로 돌아와 동아건설에 복직해서 건설과 토목 관현 일을 준히 해왔지만 ‘북파 공작원으로 복무했다’는 사실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고 한다.
| AD |
당시엔 북파공작원은 전과자들이 범죄기록 말소를 조건으로 다녀오는 곳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1968년도 초기에는 전과자나 사형수를 부대원으로 쓰기도 했으며, 그 비율은 전체의 30% 정도였고,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포섭되는 사람이 생기면서 양친이 살아있는 최소 중졸 이상 학력자를 선발했다고 한다.
북파 공작원으로 생활했던 사람은 약 1만3천여명으로, 그 중에서 약 7천여명은 사망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6천여명 정도이며, 지금도 부대는 축소돼지만 존재한다고 한다.
김선광 지회장은 “단 한차례 외출 외박 휴가없이 완벽히 격리돼 제대 후 일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과자라는 오해도 견디기 어려운 것중에 하나였다”면서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북파 공작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가 없어지고 그들의 한 역할을 인정해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젊은이들에게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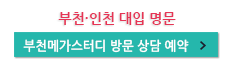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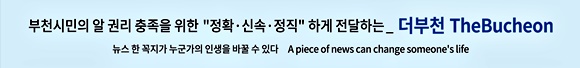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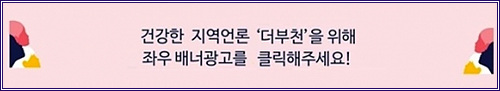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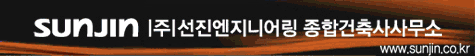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 출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베트남 출장..